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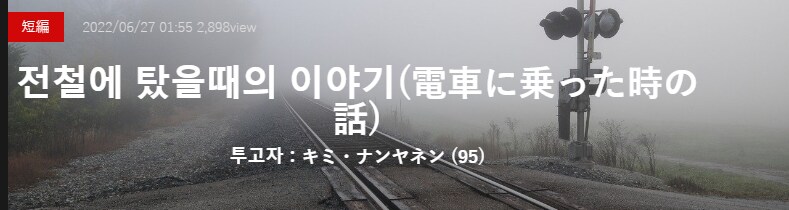
조금 비틀거리면서도 평소처럼 전철을 타고 환승역에서 단선 로컬선으로 갈아탄 바로 그때였다.
두 칸밖에 없는 로컬선의 뒤쪽 차량에 타니, 초등학교 3~4학년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객실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승객은 두 칸 합쳐도 십몇 명 정도였지만, 누구도 그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오후 3시 조금 넘은 시간이라, 학교에서 돌아가는 아이가 전철에 타고 있어도 이상할 건 없고, 승객들도 별로 개의치 않는 듯했다.
이상한 점은, 아이들은 분명 뛰어다니고 있는데 말도 하지 않고, 떠드는 소리도 전혀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철에서 큰 소리를 내면 민폐라는 건 알고 있는 듯했다.
민폐라고 생각한다면 애초에 전철에서 뛰질 말지…라고 잠깐 생각은 했지만, 그걸 지적할 힘조차 없었다.
잘 보니 아이들은 술래잡기 비슷한 놀이를 하고 있었다.
‘술래’가 어떤 색을 정하고, ‘사람(도망자)’이 그 색의 무언가를 터치하면 술래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
만약 ‘사람’이 그 색의 물건을 터치하지 못하면, 술래가 사람의 몸을 터치하는 순간 역할이 바뀌는… 그런 룰인 것 같았다.
전철에 흔들리며 가는 동안 나는 점점 더 기분이 나빠졌다.
아이들은 무언의 술래잡기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말이 없으니 다음 색이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아이들은 빨강이다, 파랑이다 하며 찾아내서는 결국 거의 모든 승객의 소지품이나 옷을 터치하고 있었다.
전철은 내가 내려야 할 역의 하나 전 역에 다다라 서서히 멈췄다.
나는 얼굴을 들어 역명을 확인하고, 아이들의 모습을 다시 보려고 했는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사람’ 역할의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가벼운 구역감이 올라와 참지 못하고 일단 그 역에서 내리기로 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전철에서 내렸고, 돌아보니 문 창문 너머로 ‘사람’ 역할의 아이가 아쉽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보였다.
전철이 곧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10분쯤 앉아 있으니 기분이 가라앉아 결국 토하지는 않았다.
화장실에서 나오고, 플랫폼의 벤치에 앉아 다음 전철을 기다렸다.
이 시간대라면 20분 간격으로 전철이 있어야 하는데, 15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역무원 말로는 무슨 트러블이 있어서 다음 전철이 바로 앞 역에서 멈춰 있다고 했다.
복구가 언제 될지 모르겠다길래, 그 역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로 했다.
집에 와서 지역 뉴스를 켜 보니, 내가 내린 전철이 심각한 탈선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대로 전철에 타고 있었다면… 인생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이었다.
계속 뉴스를 지켜보니,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 총 15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초등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뉴스를 보면서 나는 문득 떠올렸다.
결국, ‘사람’ 역할의 아이가 찾던 마지막 색이 무엇이었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그 색’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난 어떻게 되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