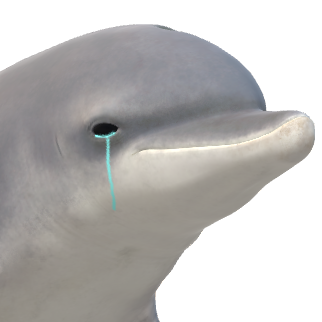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무렵이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잠결에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잠이 깨버렸다.
처음엔 바람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또렷했다.
“스르르르… 스륵…”
마치 손톱 같은 무언가가 석고보드를 천천히 긁어내리는 듯한
그저 듣는 것 만으로도 오한이 드는 소리.
이상한 건, 그 소리는 언제나 내 침대 위쪽 천장에서만 났다는 것이다.
이상한 낌새에 어느 날은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층에 누가 사냐고 물었다.
“거기 아직 공실입니다. 아무도 안 살아요.”
그날 이후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점점 더 이상한 것들이 섞이기 시작했다.
긁는 소리 사이로
“흐으… 끄으…”
무언가가 고통을 억지로 참고 내는 듯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분명히, 살아 있는 무언가의 소리였다.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짐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천장 한쪽이 뚫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보수공사 때문이라고 관리인이 말해줬던 기억이 났다.
별생각 없이,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천장 안쪽을 비춰보았다.
그 순간, 손이 멈췄다. 천장 내부는 어둡고 축축했으며, 그 한가운데!
철제 쥐덫에 목이 끼인 고양이 한 마리가
처참히 죽어 있었다.
목의 절반이 부서진 채 말라붙어 있었고,
주위 벽면은 피와 손톱으로 긁은 자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분명,누군가가 쳐놓은 덫에 걸려 며칠을 갇혀버린 채 죽지도 못하고 발버둥 치던 생물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고양이의 앞발 근처엔 익숙한 열쇠고리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그것은, 내가 자취 첫날 잃어버린 바로 그 열쇠고리였다.
나는 천장에 쥐덫을 놓지 않았다.
그럼…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