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projectmx&no=15265279
"어서 오세요, 선생님. 여기 홍차입니다."
나는 홍차를 마시며 선생님에게 마주 앉으라고 권유했다. 선생님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미리 준비한 홍차에 입을 댔다. 방금 끓인 것이라 아직 식지 않았을거라 생각하지만... 아무래도 입맛에 맞는 듯 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도 하고 싶지만 선생님도 다망하시겠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선생님이 상담하러 오는 것은 드문 일인데, 하늘이 붉게 물든 날 이후로 처음인데, 그만큼 성가신 일이 아니었으면 하네요."
"응. 그 정도로 성가신 문제는 아니야."
선생님은 잠깐 쉬고 말을 이어갔다.
"사실은, 어떻게 좀 더 친근함을 어필할 수 있을까 생각 중이야."
"친근함을요?"
이 이상 친근함을 어필해서 어쩌려는 걸까. 하렘이라도 만들 생각일까. 지금도 이미 충분히 그의 주위에는 하렘이 만들어져 있는데.
하지만 선생님이 일부러 찾아온 만큼 그 나름대로 진심일 것이다. 그것을 처음부터 부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왠지 일부 학생들이 거리를 두는 것 같아서, 가까워지려면 친근함을 어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
"흐음."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무슨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요?"
"저번에 와카모를 만났는데,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망가 버렸어."
"와카모라면 그 일곱 죄수 중 하나인 와카모인가요. 그때 뭔가 수상한 점은 없었나요?"
"으음, 그러고 보니 얼굴이 조금 붉었던 것 같기도 해."
"선생님은 소녀의 마음을 좀 더 배워야 합니다."
정말이지,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진짜로 일곱 죄수까지 사로잡았을 줄은 몰랐다. 역시 그답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오리도 피하고 있어."
"게헨나의 선도위원이었죠. 짐작 가는 바는 있나요?"
"그게 실은 딱히 없어."
"어쩌면 첫인상으로 나쁜 인식이 박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녀와의 첫만남은 어땠죠?"
선생님은 회고하듯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처음 만난 건 아비도스에 파견되었을 때였지."
"그러고 보니 아비도스에 처음 부임했었죠. 그래서요?"
"응, 아비도스 아이들하고 라멘을 먹는데 미사일이 날아왔어."
"그렇군요. 확실히 어색할지도 모르겠네요."
"으음, 그런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 때문임이 틀림없는 것 같지만 선생님은 그다지 납득이 가지 않는 모양인지, 작은 신음소리를 흘리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만남은 어땠나요?"
"두 번째는... 히나에게 중개를 부탁했을 때였지. 다리를 핥았어."
"......"
아무래도 어젯밤 책에 빠져 밤을 새운 것이 화근인 듯 하다. 환청을 들은 것 같다. 밤늦게 깨어있는 것도 적당히 해야 할 것 같다.
"죄송하지만 잘못 들었는데 다시 말해주시겠어요?"
"응, 그때는 다리를 핥았어."
"그거네요."
"그거라니... 뭐가?"
"당연히 다리를 핥았다는 부분이겠죠? 그건 그냥 성희롱이잖아요."
이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지 선생님은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지만, 오히려 내가 선생님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도 엉뚱하다는 자각은 있지만, 그는 더 심했다. 오히려 그러한 점이 매력이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더 있나요?"
"그리고 미사키도. 우연히 마주치거나 하면 엄청 싫은 표정을 하거든."
"그것도 그렇겠죠."
쏜 장본인은 아니더라도 선생님을 상처입혔는데 그 당사자가 말을 걸어 온다면 굉장히 어색할 것이다.
"나쁜 생각은 아니지 않아?"
역시나 모두 친근함과는 무관하다. 설령 친근함을 어필한다고 해도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용할 수 있겠다 싶었다.
"흐음, 알겠어요. 저한테 한 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정말이야...! 앗, 미안!"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뒤로 물러서며 내 양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대로 있는 것도 좋았지만, 내 입으로 말하는 것도 멋이 없었다.
"그래서 묘안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생님을 보며 나는 입꼬리를 작게 올렸다.
"공감성을 이용하는 거에요."
"공감성?"
"네. 누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먹고 싶어지지 않나요? 같은 방식을 쓰는 거죠."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현을 하는 선생님이지만 과연 어디까지 이해했을까.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선생님이 학생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진을 올리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모모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버리죠. 그래야 눈에 띌 테니까요."
"학생과 친밀하게라, 그게 안 돼서 상담을 온 건데."
"뭐, 모든 학생이 거리를 두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친하다고 할 수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렇구나, 그런 학생들에게 부탁하면 되겠네. 누가 좋을까..."
"여기 있지 않나요?"
나는 선생님을 빤히 쳐다봤다. 대체 여기서 왜 고민하는 걸까. 이것을 위해 열심히 유도했는데.
"세이아?"
"네. 제가 생각했으니 책임지고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아니면... 저로서는 불만인가요?"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도발하듯 묻자 선생님은 손사래를 치며 부정했다. 이런 부분이 귀여워서 자꾸만 장난을 치는 것은 나의 나쁜 버릇이라 고쳐야 할 것 같다. 그게 이번은 아니지만.
"그럼 프로필로 쓸 사진을 찍을까요?"
나는 선생님의 옆에 서서 팔에 매달렸다.
"세, 세이아?!"
"왜 그러시나요? 어서 찍으시죠."
"좀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마음의 거리는 몸의 거리라고 하죠. 신체 접촉이 많을수록 친밀함을 어필할 수 있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확실히 그런가. 미안, 세이아.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생각해줬구나."
"괜찮습니다. 어서 찍죠."
납득하는 선생님의 모습에 나는 작게 미소를 지었다. 전형적인 오도다. 선생님의 상담 취지는 친근함 어필이지 나와의 친근함 어필이 아니다. 다행히 선생님은 깨닫지 못한 듯 했다.
"선생님이 찍어주셨으면 하는데, 괜찮죠?"
"물론."
선생님은 그대로 몇 장의 사진을 찍은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말 고마워, 세이아. 상담하길 잘했어."
"저야말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모처럼 오신 김에 다과회라도 어떠신가요?"
"미안, 이후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길 잘한 것 같네요."
"다음에 보충할게!"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감사 인사를 하며 기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는 선생님. 그 모습을 배웅하며 나는 식어버린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정말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다음날, 선생님의 모모톡 프로필 사진이 나와의 투샷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키보토스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선생님에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입가의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나는 다시 독서에 집중하려고 했다. 그 때...
"세이아 씨, 할 얘기가 있는데요."
"세이아짱, 그건 무슨 의도일까?"
방 밖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오늘은 책벌레가 되기엔 그른 것 같다. 책을 덮고 방문객을 기다렸다.
쾅쾅
힘차게 열린 문 너머에는 관자놀이가 부들부들 떨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 그런 두 사람을 앞에 두고 나는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두 사람 다. 여기 홍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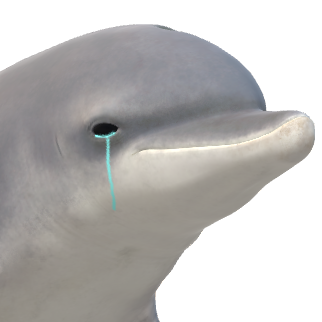

![[블루아카,소설] 친밀감 어필을 위해 모모톡 프사를 학생과 투샷으로 하는 선생님_1.webp](https://i1.ruliweb.com/img/25/05/27/1970f9f3cd44df8a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