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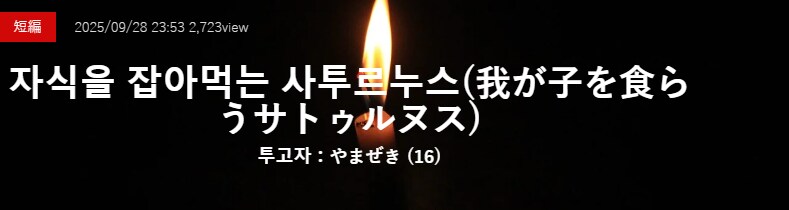
로마 신화에는 사투르누스라는 신이 있다.
그는 장차 자기 자식이 자신을 왕위에서 끌어내릴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그 공포 때문에 태어나는 자식들을 차례로 집어삼켰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려진 그림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도 한 번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좋겠다.
공포에 사로잡힌 표정으로 사투르누스가 자기 아이를 먹고 있는데,
딸을 둔 부모로서는… 무섭다기보다 슬픈 기분이 든다.
서론은 이쯤 하고,
며칠 전 출장으로 중부 지방에 갔을 때의 이야기다.
맡고 있던 일도 마무리했기에 그날 묵을 숙소로 향했다.
프런트에서 이름을 말했지만, 회사 쪽 실수로 예약이 잡혀 있지 않았다.
결국 내가 직접 숙소를 찾아야 했다.
하필이면 여름휴가 시즌이라 중심가의 비즈니스 호텔은 거의 만실이었고
예약도 잡히지 않아 완전히 난감해졌다。
어쩔 수 없이 중심가에서 벗어나 차를 몰고 가는데,
산 기슭에 러브호텔 하나가 보였다.
낮 동안의 작업으로 완전히 지쳐 있던 나는
이제 러브호텔이라도 상관없다 싶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시골에서 흔한, 방마다 코티지처럼 따로 떨어진 구조여서
차를 세우자마자 바로 방으로 올라갔다.
조금 오래된 냄새가 나긴 했지만 청소도 잘 되어 있었고
방 안에서 음식 주문도 가능해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호텔보다 더 쾌적했다.
…딱 한 가지 거슬리는 게 있었다면,
TV 옆에 걸려 있는 그림이다.
서론에 언급한 바로 그 그림,
'자식을 먹는 사투르누스'가 걸려 있었다.
“이런 기분 나쁜 그림, 연인이 오면 분위기 완전히 깨는 거 아니냐?”
그때의 나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슬슬 잘까 싶어 침대에 누웠다.
고개를 돌리니 사투르누스와 눈이 마주친다.
눈을 부릅뜨고, 아이를 찢어발라 먹고 있다.
솔직히 너무 혐오스러워 보고 싶지도 않아
서둘러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썼다.
가볍게 취해 있던 탓인지 금세 잠이 들었다.
…꿈을 꾼다.
누군가가 내 몸을 붙잡고 있다.
내 몸통보다 더 큰 손으로,
손가락 끝이 박힐 정도의 힘으로 움켜쥔다.
그 존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로 중얼거리고 있다.
거친 숨결이 내 얼굴에 걸리고,
몸을 쥐어짜는 힘이 점점 강해진다.
고통과 공포에 패닉이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것이 얼굴을 가까이 들이댔다.
사투르누스다.
그 방의 그림 속에 있던 바로 그 존재였다.
그 그림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광기 어린 눈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를 보는 그 사이에도 끝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다.
다음 순간, 그 녀석은 입이 터질 것 같이 크게 벌리고는 내 오른팔로 물었다.
이가 살을 파고들어 뼈에 닿는 감각이 전해진다.
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극한의 고통에
나는 목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들은 적 없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팔이 거칠게 확 뜯겨 나갔다.
얼굴을 피로 물들이며
놈은 내 팔을 쩝쩝 씹어 삼켰다.
몇 초 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내 얼굴을 노려보더니
다시 입이 찢어질 만큼 크게 벌어졌다.
놈의 입이 천천히, 내 머리를 향해 다가온다.
빠져나오려 해도,
내 몸을 붙잡은 거대한 손이 꿈쩍도 하지 않고
버둥거릴수록 손가락이 살에 깊이 파고든다.
그리고 그대로 내 머리가 사투르누스의 입 안으로 들어간다.
피와 침이 뒤섞인,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절규했지만
목소리는 입 안에서 울려 퍼질 뿐,
냉혹하게도 이빨이 내 목덜미에 서서히 파고들었다.
그대로 확 하고 뜯겨 나가는 느낌과 함께
내 의식은 끊어졌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심장은 튀어나올 듯 뛰고 있었고
양동이를 뒤엎은 듯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허둥지둥 오른팔을 확인했다.
꿈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팔이 붙어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크게 숨을 내쉬었다.
그나저나 정말 너무 현실적인 꿈이었다.
놈의 숨결, 통증, 고통, 냄새.
정말로 사투르누스에게 먹히고 있는 듯한 생생한 감각이었다.
“그건 그냥 꿈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일어나 냉장고에서 물을 마셨다.
TV 옆에 걸린 사투르누스의 그림을 보고 있자
다시 그 꿈을 꿀 것 같아
벽에서 떼어 뒤집어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또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달랐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감정이
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불안, 초조, 분노, 공포.
무언가에 씌인 것 같은 감각.
차분한 나 자신 옆에서
그 감정들이 머릿속을 뒤엉키며 휘몰아쳤다.
호흡이 거칠어진다.
진정하려 해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어깨가 계속 들썩이며 숨이 가빠진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목소리가 귀를 찢었다.
나는 무언가 작은 것을 붙잡고 있었다.
분노 같기도 하고… 그러나 불안과 공포가 섞인 감정으로 손을 내려다봤다.
그곳에는 딸이 있었다.
착각할 리 없다.
아내와 함께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올해 세 살이 된 사랑스러운 내 딸이었다.
딸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다.
장난으로 혼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표정과 목소리로.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될지 나는 알고 있었다.
글로 옮기는 것조차 꺼려질 만큼 끔찍한 내용이라
여기에는 쓰지 않겠다.
다시 꿈에서 튀어나오듯 깼다.
시각은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때.
입 안에 남은 쇳맛 같은 냄새와 식감이 떠올라
나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꿈속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딸을 해친 것 같은 감각이 남아
토하면서 울었다.
그 방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았던 나는
정산기를 통해 계산을 끝내고
차에 올라탄 뒤
몇 시간을 들여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그 후로 같은 꿈을 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서 그 그림을 보면
그 꿈이 떠올라 가능하면 보지 않으려 한다.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던 딸이,
이제는 내가 다가가기만 해도 울기 시작한다는 것.
